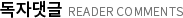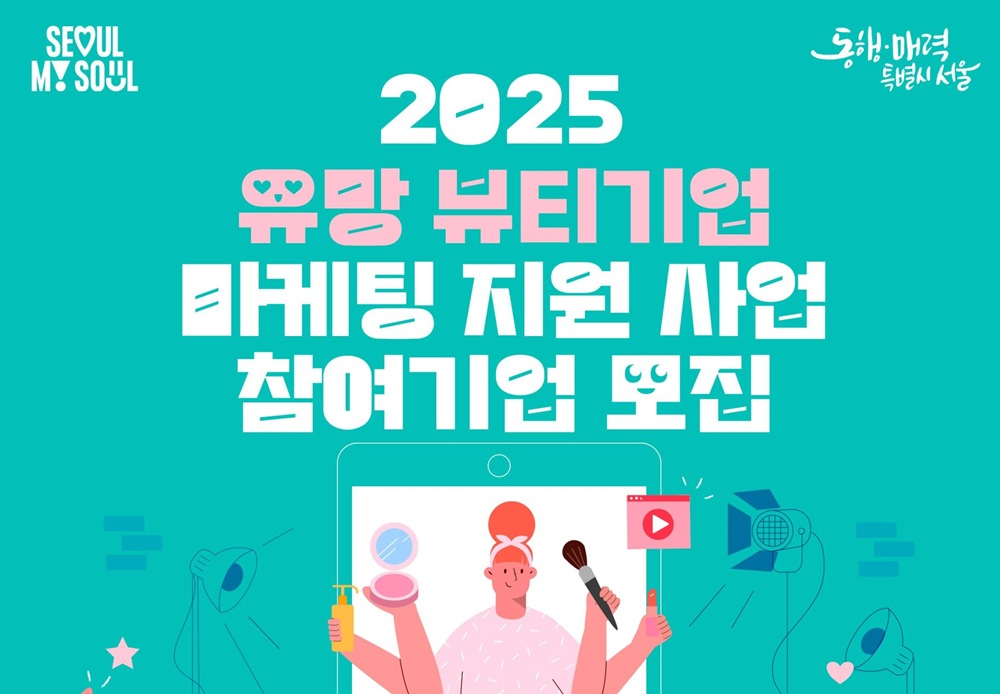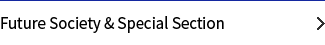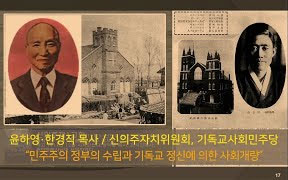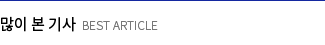하지만 우리 정부는 반가운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며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 참여가 확정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높아진 위상을 확인하는 외교적 쾌거가 될 수 있지만 G7 확대 목적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고 있을 경우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으로선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인 듯 싶다.
뉴시스에 따르면, G7에는 현재 선진국으로 불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이 멤버다. 지난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여 시작됐다. 이후 1975년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며 G5 정상회의로 승격됐고,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며 G7이 됐다.
1997년에는 러시아가 참여했지만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합병으로 G7정상들은 G8에서 러시아를 다시 제외하고, G7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주요 20개국(G20)회의 멤버다. G7 참여가 확정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한국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한국, 인도, 호주 등은 세계 공급망 전환에 핵심 국가들이고,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들어가는 국가들인 만큼 미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공간을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한국이 미중과 더 이상 거리를 두거나 모호성을 유지하는 단계를 넘어갔다. 시장경제 체제, 개방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명분과 원칙을 갖고 미중이 전면적인 편가르기식 패권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우리와 비슷한 입장을 가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익을 위한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한다.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미묘한 입장에 놓인 것이 사실이다. 신문은 “그러나 눈치 보기가 길어져 선택의 골든 타임을 놓치면 미국 주도의 새 경제블록에서 낙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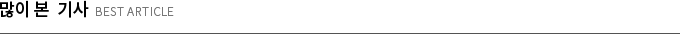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