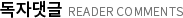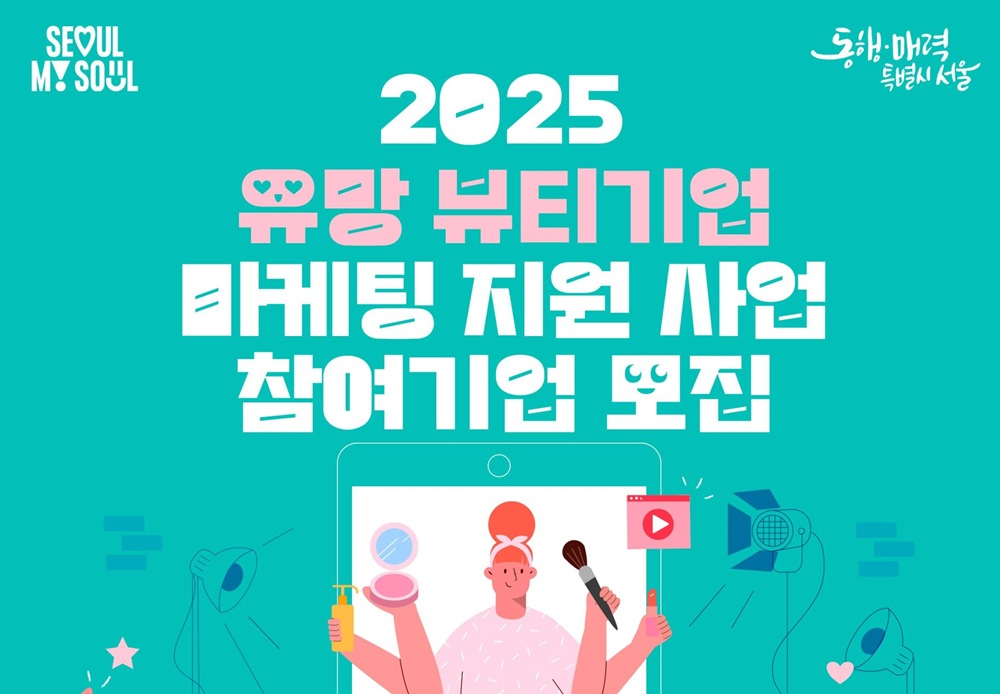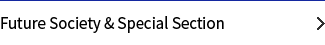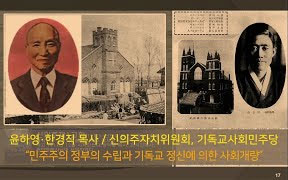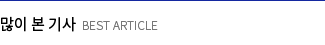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위기를 맞고 있다. 중앙일보는 최근 ‘포스트코로나 한국 산업의 길’ 시리즈 첫 번째로 ‘반도체 세계대전’을 다루면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중 간 신냉전 시대를 맞아 메모리는 ‘반도체 코리아’의 아성을 지키고 동시에 비메모리로 보폭을 내딛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매출 기준)은 4183억 달러(약 516조5586억원),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26.7%(1116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가 73.3%(3067억 달러)를 차지했다(시장조사업체 가트너). 대략 메모리 30%, 비메모리 70%의 비중이다. 한국은 이 중 30% 시장의 강자일 뿐 70% 시장의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D램과 낸드플래시 위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44.1%)와 SK하이닉스(29.3%)의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는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디지털 사진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비메모리 시장은 이런 제품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으로 양분된다. 한국은 비메모리 시장 어느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팹리스)와 위탁생산(파운드리)으로 양분되는 비메모리는 기술 장벽이 높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비메모리 분야는 5G 통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위주로 형성된 이유는 1970년대 반도체 산업 초기 일본을 따라 메모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도 많고 기술 장벽이 높은 비메모리에 뛰어들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매출 기준)은 4183억 달러(약 516조5586억원), 이 중 메모리 반도체가 26.7%(1116억 달러), 비메모리 반도체가 73.3%(3067억 달러)를 차지했다(시장조사업체 가트너). 대략 메모리 30%, 비메모리 70%의 비중이다. 한국은 이 중 30% 시장의 강자일 뿐 70% 시장의 점유율은 4%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국은 D램과 낸드플래시 위주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44.1%)와 SK하이닉스(29.3%)의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는다. 하지만 비메모리 시장은 상황이 녹록치 않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디지털 사진기에 들어가는 이미지센서 등 종류가 다양하다. 비메모리 시장은 이런 제품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으로 양분된다. 한국은 비메모리 시장 어느 부문에서도 1위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설계(팹리스)와 위탁생산(파운드리)으로 양분되는 비메모리는 기술 장벽이 높고 가격도 안정적이다. 비메모리 분야는 5G 통신과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의 등장에 따라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위주로 형성된 이유는 1970년대 반도체 산업 초기 일본을 따라 메모리에 집중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도 많고 기술 장벽이 높은 비메모리에 뛰어들지 못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미·중의 반도체 패권 충돌로 우리의 메모리 1위 입지는 갈수록 불안한 상황이다. 중국이 우선 메모리 반도체 자급자족을 외치며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며 맹추격해 오고 있다. 중국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CXMT)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D램(8GB DDR4) 생산 자주화를 위해 34조원을 투입한 것이 한 사례다.
중앙일보는 “우리가 도전장을 낸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미국이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미국이 미국 장비나 설계 기술이 담긴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것은 기술 장벽의 단적인 사례"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비메모리는 한국 반도체가 가야 할 길이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반도체 비전 2030’을 내걸고 2030년까지 10년간 130조원을 투자해 비메모리 시장 1위를 달성하겠다고 선포했다. 삼성의 전략은 파운드리 시장을 우선 공략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삼성이 파운드리 시장 공략을 위해선 대만의 TSMC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며 “한국이 반도체 강국 입지를 다지려면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대해 균형을 잡고 투자를 계속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재 양성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메모리 분야에서 생산능력을 늘리는 초격차 전략을 내세운다면 비메모리 분야에선 우수한 인재를 많이 길러내 ‘신격차’를 만들어내야 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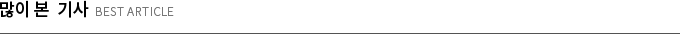

.jpg)